[김경훈 기자] 화성기업혁신센터 탄생의 의미
-화성가치창조 동분서주 최영근 시장은 '경제시장'
입력날짜 : 2007. 03.08. 08:38 화성기업혁신센터가 문을 열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센터가 문을 열기까지 과정에서 ‘그럴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무엇인가가 서운한 점이 있다.
사실 화성시는 면적이 서울보다 넓고, 생활권이 인근 평택시 처럼 3개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잠재력은 우수한 반면 기반시설이 부족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아니다.
특히 몇 개의 산업단지에 약8000개의 사업체가 있지만 대부분 50인 미만이거나 경쟁력이 없는 제품들을 생산하거나 일꺼리가 없어 근근히 생활하면서 구인난과 물류이동이 쉽지 않은 악조건이 반복되온 곳이 화성이다.
이같은 이유로 해서 화성의 이미지는 끝없이 추락해 왔고, 살인의 도시라는 오명까지 받는 수모를 겪어와야만 했다.
그러나 최영근 화성시장이 공조직 개편을 통한 화성을 틀어쥐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웬만한 자신감이 없이는 가능하리라 보지도 않지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초과정을 보면 불가능이란 단어가 우습게 여겨지는 것도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
최시장은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기업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물론 중소상공단체나 상공회의소가 있지만 획일적인 비즈니스가 아닌 기업인들이 모여 토론하고, 정보를 나누며, 같이 운동하면서 전문적인 자문에다 먹고 마시는 공간이 없을까 고민에 빠졌다는 최영근 시장.
최시장의 역발상이 지금껏 필요성만 대두되어 왔던 기업인들만의 카페인 ‘화성기업혁신센터’가 문을 열게된 것이다.
화성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인 화성새마을회가 장소를 제공하고, 화성상공회의소가 운영을 한다는 것이 화성기업혁신센터 탄생과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행정과 주민과 기업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새로운 양상의 빅딜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화성기업혁신센터의 개소 과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시장은 두가지의 분명한 약속을 했다.
첫째는 공무원 조직의 혁신과 둘째, 기반시설의 조기 구축이다.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동맥경화에 걸린 도로와 민원처리를 수술대 위로 올린 것이다.
기한내 처리하면 오히려 이상했던 화성시가 하루 20명의 계장급 공무원들을 30분 조기출근을 시켜 밀린 민원을 처리하고, 절차를 원스탑 방식으로 개선시키자 시민들에게 ‘아니 벌써’라는 개그 유행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문제는 센터가 개소됐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먹고살기 위해 대충대충 해왔던 모습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자신들의 공간인 혁신센터의 전문가들을 찾아 배우고, 나누고, 제공해서 환골탈태해야만 ‘자연도태’라는 엄청난 현실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행정은 자신들의 제도권안에 기업인들을 맞춰왔던 관행을 과감히 고쳐 기업에게서 배우고, 기업의 눈높이로 자세를 고쳐 앉아야 한다.
또 기업은 안되는 것을 최고 결재권자를 찾아 급행료(?) 물어가며, 해결하려는 방법에서 담당자와 전문가들은 물론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정한 해법을 찾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머지 않아 인구 130만 거대도시가 될 화성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32만 화성시민들의 가치창조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최시장에게 ‘경제시장’이라는 별칭을 주고 싶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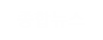











 기사 목록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메일로 보내기 













